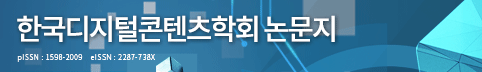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opyright ⓒ 2025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인 관련 간호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D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가족건강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노인차별주의와의 차이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t=-3.760, p<.001),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할수록(F=16.426, p<.001)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높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F=18.173, p<.001) 노인차별주의 정도는 낮았다. 노인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r=0.486, p<.001)와 가족건강성(r=-0.20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의 예측요인으로는 노인에 대한 태도(β=0.424, p<.001), 성별(β=-0.177, p=.001),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로 생각(β=0.169, p=.001), 노인 문제의 관심 여부(β=-0.165, p=.001)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의 32.7%(F=35.449, p<.001)를 설명하였다. 이중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노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증진하는 경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ageism in nursing student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nursing educ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 to May 30, 2024, with 285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ity D, to examine their levels of ageism, knowledg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family health.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cluded gender (t = -3.760, p < .001),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s a burden (F = 16.426, p < .001), and interest in elderly issues (F = 18.173, p < .001). Age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s (r = 0.486, p < .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health (r = -0.206, p < .001). Ageism was predicted by attitudes (β = 0.424, p < .001), gender (β = -0.177, p = .001),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as a burden (β = 0.169, p = .001), and interest in elderly issues (β = -0.165, p = .001), collectively explaining the variance of 32.7% (F = 35.449, p < .001). The findings showed that enhancing experience-based learning is crucial for fostering positive attitudes and promoting direct interactions with the elderly.
Keywords:
Elderly, Knowledge, Attitude, Family Health, Ageism키워드:
노인, 지식, 태도, 가족건강성, 노인차별주의Ⅰ. 서 론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23년 18.2%로 현재 고령사회이며, 2025년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7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이처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의료비 지출 및 부양부담 상승, 노인 빈곤, 노인 학대, 독거노인 및 고독사 증가 등 노인 관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2].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장애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에서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 이는 노인 스스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차별(ageism)은 연령차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며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고 있어 어느 연령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편견이나 차별 등 부정적인 의미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3].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해 ‘약하고 무기력하다’, ‘보수적이다’, ‘의존적이다’ 등과 같은 선입견이나 통념을 가지며, 더 나아가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기도 한다[4]. 우리나라 청년층은 과거에 비해 고령자와 같이 생활 또는 접촉할 기회가 적어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중문화의 영향 등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5],[6]. 특히 건강한 노인보다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신체기능이 감소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러한 노인차별주의 인식은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킬 수 밖에 없고 상대적 약자인 노인은 젊은 세대로부터 혐오의 시선을 받으며 사회적 기여로 볼 때 마땅한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더욱 고착화 되어간다[8].
또한, 의료인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노인 환자가 적절한 건강관리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한다[9],[10]. 의료전문가들은 의료현장에서 과다진료나 과소진료와 같은 비적정진료, 노인소외와 보호자 의존, 양극화된 서비스와 빈곤 노인에 대한 노인차별주의가 실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의료전문인의 노인차별적 태도는 노인 스스로 부정적 이미지를 내재화하고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켜 결국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11],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간호사가 노인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로서 노인간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12].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노인 간호의도와 연령주의 간에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13], 연령주의가 노인 돌봄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노화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13],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노인에 대해 왜곡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국 노인차별로 이어지게 된다[15]-[17].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했으며[15], 노인 관련 과목이 상대적으로 많고, 주로 노인 관련 기관으로 실습 및 봉사를 나가는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18]. 따라서 간호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봉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향후의 간호 실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노인차별주의와 같은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가족건강성이다[16].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구성원 간에 원만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여 가족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체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가족 체계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9].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노인차별 등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20]. 따라서 가족 내에서 학습된 문화가 곧 사회문화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16]. 선행연구[16],[17],[21]에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차별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효의식[22], 노인대상 봉사활동 경험[23],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14],[23], 조부모와 동거경험[16], 인권의식[14], 휴머니즘[13], 노화지식[13],[16], 가족건강성[16] 등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와 관련된 노인 관련 경험(노인 동거 경험, 노인 관련 봉사 및 교육 경험), 노화지식과 태도 및 가족건강성을 포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노인 관련 경험, 노화지식, 태도 및 가족건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엄한 간호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 관련 간호교육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 노화지식 및 태도, 가족건강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와 노화지식 및 태도,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Ⅱ.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 관련 경험,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술적 조사연구로 실시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중 설문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서명으로 동의한 28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자료수집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응답 시간은 평균 10분∼15분 내외였고, 조사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가 189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별 2개 반에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총 2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노화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3]가 개발한 Fact on aging quiz(FAQ)를 한정란 등[18]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개 문항이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신체적 영역 11문항, 심리적 영역 6문항, 사회적 영역 8문항이다. 각 문항은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한정란 등[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64이었고, 김승용과 윤미진[22]은 .72,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 등[24]이 개발한 semantic differential attitude scale을 임영신 등[25]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반되는 형용사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긍정적’ 1점에서부터 ‘매우 부정적’ 7점으로 구성된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임영신 등[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은 유영주 등[19]이 개발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개 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가족탄력성 7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상호존중과 수용 5문항, 가족 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 경제적 안정과 협력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유영주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차별주의를 확인하기 위해 Fraboni 등[26]이 개발한 Fraboni scale of ageism(FSA)를 김지연 등[27]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이며,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정서적 회피 7문항, 차별 5문항, 고정관념 6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지연 등[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노화지식과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정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으로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노화지식과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성 224명(78.6%), 남성 61명(21.4%)이었고, 학년은 1학년 73명(25.6%), 2학년 64명(22.5%), 3학년 80명(28.1%), 4학년 68명(23.8%) 이었다. 노인과 동거한 경험은 없는 경우가 159명(55.8%), 노인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은 없는 경우가 193명(67.7%)으로 많았고,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은 있는 경우가 181명(63.5%)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는 그런 편이다가 114명(40.0%), 보통이 113명(39.6%), 아닌 편이다가 58명(20.4%) 이었고,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10명(35%), 그렇다 68명(23.9%), 보통이다 99명(34.7%),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8명(27.4%), 전혀 그렇지 않다가 30명(10.5%) 이었으며,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다가 52명(18.2%), 보통이 202명(70.9%), 없다가 31명(10.9%)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표 1과 같이 성별(t=-3.760, p<.001),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F=16.426, p<.001),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F=18.73, p<.001)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높았고,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이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사후 분석한 결과, 관심이 많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낮았다.
3-2 대상자의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 정도
대상자의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노화지식 정도는 평균 12.75점, 평균 평점은 0.51점이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79.84점, 평균 평점은 3.99점(7점 척도) 이었다. 가족건강성은 평균 87.11점, 평균 평점은 3.95점(5점 척도) 이었고, 노인차별주의 정도는 평균 44.50점, 평균 평점은 2.47점(5점 척도) 이었다.
3-3 대상자의 노화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건강성 및 노인차별주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와 노화지식과 태도 및 가족건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인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r=0.486,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족건강성(r=-0.206, p<.001)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3-4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예측요인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중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가족건강성을 독립변수로 보고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여성=1, 남성=0)과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많다=1, 없다=0)는 더미변수화 하였다.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검토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r=-0.226∼0.486로 나타나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이었고, Durbin-Watson 값이 2.131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의 문제가 없었다. 공차한계는 0.904∼0.999로 0.1 이상을 보였고, VIF 값은 1.001∼1.106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특이값을 Cook’s Distance 값으로 계산한 결과 0.000∼0.07로 1을 초과한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노인에 대한 태도, 성별,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 및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를 포함한 모형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대해 32.7%(F=35.449, p<.001)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이 중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변수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고령시대에 노인간호의 주요 인력으로 성장할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정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이 노인간호 중재시 노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 관련 간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평균 평점은 2.47점(5점 척도)으로 나타나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중간 정도이었고, 간호대학생들에게 동일 측정도구를 사용한 김현주와 이영미[16]는 2.30점(4점 척도)과 하수정[21]의 2.21점(4점 척도)으로 본 연구대상자보다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강혜민과 신수진[12]의 2.06점(4점 척도)과 김주아와 하지연[28]은 2.20점(4점 척도)으로 나타났으며, 강혜민과 신수진[12]의 연구에서는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료인은 노인 고객과의 만남에 있어서 신체·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이들의 역할 수행은 노인들의 기능적 상태, 돌봄 선호 및 기대수명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29]. 특히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는 노인의 외래 및 입원을 통한 병원 방문 횟수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1]. 만일 노인 고객이 노인에 대해 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게 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고객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신뢰관계 형성 등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됨을[11]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차별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노인의 성장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노인의 경험과 지혜의 축적, 숙련도의 향상, 활동 능력의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 통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11]. 향후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의료인의 정기적인 노인 관련 교육의 제공과, 더 나아가 노인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노인차별주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심했고, 노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선과 이정화[1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인차별주의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곽윤복 등[13]의 연구에서는 노인 문제의 관심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을수록 노인간호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차별주의 인식을 분석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노인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한 경험과 노인 대상 봉사 경험과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군이, 그리고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낮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14]-[16],[23], 노인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21], 노인 관련 봉사 활동을 한 군이 안 한 군에 비해[6],[14],[21] 노인차별주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장경애와 허성은[23]의 연구에서는 노인 동거 경험과 노인 대상 봉사 활동 경험 및 노인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노인차별주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와 노인 관련 경험(노인 동거 경험, 노인 관련 봉사 및 교육 경험) 간의 유의한 차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간호대학 과정에서부터 세대 간 멘토링, 말벗 서비스, 노인대학, 노인가정방문 등의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및 지역사회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간호대학생과 노인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인 관련 교과목으로 운영하거나 노인 강사 초청 특강과 노인 유사체험 활동 등의 비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족건강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함을 의미한다. 하수정[21]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노인에 대한 지식과 가족건강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김현주와 이영미[16]의 연구에서는 노화지식과 가족건강성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김영선과 이정화[15]의 연구에서는 노인 지식과 노인 태도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곽윤복 등[13]은 노인에 대한 지식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노인 간호의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노화지식은 노인차별주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주아와 하지연[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13],[15],[16]에서 노인차별주의와 노화지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노화지식은 학년 및 노인 관련 교과목 수강여부 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중요하며, 또한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은 서로의 입장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도우며,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19]. 또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 모임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가족문화와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19]. 즉 가족건강성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 관련 자원봉사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가족건강성의 강화는 중요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예측요인으로는 노인에 대한 태도, 성별,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이는 노인차별주의에 대한 32.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주아와 하지연[28]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임유진[30]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노인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의 차별적인 편견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노인차별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28]. 따라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과 관련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노인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단순 지식 전달 위주로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배운 노인 관련 이론과 실습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및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러닝 형태의 교과목 운영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노인차별을 야기하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가 상호 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노인차별주의가 심했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차별주의 정도는 낮았으며,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잘못된 편견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노인 봉사 활동 등 노인과 관련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표본추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 다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는 노인 관련 이론과 실습 교과목 운영 및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차별주의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 성별, 노인이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여부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그중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노인 관련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과 노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노화지식이 노인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관련 실습 및 지역사회 기반 학생과 노인의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Statistics Korea. 2023 Senior Citizen Statistics [Internet]. Available: http://kostat.go.kr, .
-
J. Kim, H. Oh, and K. Ju, “Experiences of Ageism and “Self-Ageism”,”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0, No. 4, pp. 659-689, August 2020.
[https://doi.org/10.31888/JKGS.2020.40.4.659]

- E. B. Plamore,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2nd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9.
-
J. Angus and P. Reeve,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25, No. 2, pp. 137-152, April 2006.
[https://doi.org/10.1177/0733464805285745]

-
S. Y. Kim, T.-H. Sohn, S. Chang, and K.-J. Moon,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erontological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1, No. 1, pp. 53-84, March 2016.
[https://doi.org/10.21194/kjgsw.71.1.201603.53]

-
K. Lee and J. Lee, “The Influence of the Older Adults-Related Experience on the Image of Older Adults and Age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40, No. 6, pp. 1267-1286, December 2020.
[https://doi.org/10.31888/JKGS.2020.40.6.1267]

-
Y. Haron, S. Levy, M. Albagli, R. Rotstein, and S. Riba, “Why Do Nursing Students Not Want to Work in Geriatric Care? A 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50, No. 11, pp. 1558-1565, November 2013.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3.03.012]

-
M. S. North and S. T. Fiske, “An Inconvenienced Youth? Ageism and Its Potential Intergenerational Root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8, No. 5, pp. 982-997, September 2012.
[https://doi.org/10.1037/a0027843]

-
Y. J. Lee and J.-A. Song,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Gerontophobi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3, No. 1, pp. 1-12, February 2021.
[https://doi.org/10.17079/jkgn.2021.23.1.1]

-
T. H. Ha and E. Y. Lee, “Comparison between Generations of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32, No. 3, pp. 515-531, May 2021.
[https://doi.org/10.7465/jkdi.2021.32.3.515]

-
H. I. Oh, K. H. Ju, and J. H. Kim, “A Study on the Ageism and Age-Integrated Percep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 Groups with Experience in Treating Elderly Pati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61, pp. 59-91, September 2018.
[https://doi.org/10.16975/kjfsw.2018..61.003]

-
H. Kang and S. Shin, “The Effects of Tertiary Hospital Nurses’ Ageism and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on Geriatric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 24, No. 4, pp. 355-365, November 2022.
[https://doi.org/10.17079/jkgn.2022.24.4.355]

-
Y.-B. Kwak, E.-H. Lee, and M.-S. Oh,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Humanism, and Ageism on Intention toward Elderly C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1, pp. 440-449, January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1.440]

-
E.-Y. Yeom, “The Effect of Ageism, Elderly Human Right on Attitude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7, No. 2, pp. 345-350, May 2022.
[https://doi.org/10.21097/ksw.2022.5.17.2.345]

-
Y.-S. Kim and J.-H. Lee,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n the Discrimin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Dental Hygiene Science, Vol. 6, No. 2, pp. 129-139, December 2023.
[https://doi.org/10.22753/JKDHS/2023.6.2.129]

-
H. J. Kim and Y. M. Lee, “Influence of Ageing Knowledge and Family Strengths on Ageism among th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21, No. 2, pp. 83-90, December 2018.
[https://doi.org/10.7587/kjrehn.2018.83]

- S. R. Park,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d Testing Moderating Effect of Elder Knowledg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2, No. 1, pp. 279-302, March 2015.
- J. Han, H. Ryu, and G. Kim,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3, pp. 121-139, December 2007.
-
Y. Yoo, I. Lee, S. Kim, and H. Choi, “Development of Korea Family Strengths Scale(KFSS-Ⅱ),”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4, pp. 113-129, August 2013.
[https://doi.org/10.7466/JKHMA.2013.31.4.113]

- Y.-J. Y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9, No. 2, pp.119-151, August 2004.
- S. J. Ha, Factors Affecting Elderly Discrim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amily Health, and Image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February 2023.
-
S.-Y. Kim and M.-S. Youn, “Factors Influencing the Discrimination Consciousness of the Elderl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1, pp. 369-378, November 2018.
[https://doi.org/10.5392/JKCA.2018.18.11.369]

-
K.-A. Jang and S.-E. Heo, “Effect of the Elderly-Relate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on Ageism,”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3, pp. 185-194, March 2020.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3.185]

-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E. Pittman Jr., and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October 1984.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Y. S. Lim, J. S. Kim, and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31-46, April 2002.
-
M. Fraboni, R. Saltstone, and S. Hughes,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Vol. 9, No. 1, pp. 56-66, 1990.
[https://doi.org/10.1017/S0714980800016093]

-
J.-Y. Kim, M.-H. Kim, and K.-H. Mi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raboni Ageism Scale(FSA): A Study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6, No. 4, pp. 89-106, November 2012.
[https://doi.org/10.21193/kjspp.2012.26.4.006]

-
J. Kim and J. Ha,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5, No. 5, pp. 393-403, December 2019.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5.393]

- K. M. Ouchida and M. S. Lachs, “Not for Doctors Only: Ageism in Healthcare,” Generations, Vol. 39, No. 3, pp. 46-57, September 2015.
-
Y. Lim, “Factors Influencing Behavior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5, No. 2, pp. 71-81, June 2017.
[https://doi.org/10.15268/ksim.2017.5.2.071]

저자소개

1997년: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2004년: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1998년~2013년: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교수
2013년~현 재: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지역사회보건, 건강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