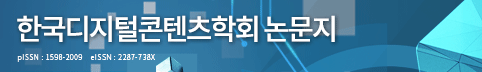
데이터 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이 재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Copyright ⓒ 2025 The Digital Contents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제품의 지속적인 재구매 의향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차이만 도출되었다. 특히 6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련 인지 수준이 가장 취약한 연령대이지만 다크패턴의 피해 경험이 가장 적은 이유는 낮은 인지 수준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이며,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는 주이용자층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수집 관련 정보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level of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periences of privacy dark patterns on the intention to continuously repurchase products via T-commerce.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commerce users and experiences of privacy dark patterns, no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users; only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group of the users existed. Users in their 60s exhibited the weakest levels of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least experiences of privacy dark patterns.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intention to repurchase via T-commerce is the level of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The experience of privacy dark patterns is not a decisive factor. Hence, T-commerce operators should prioritize efforts to increase the rea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to raise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considering the ages of their main user groups.
Keywords:
T-Commerce, Dark Pattern,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rivacy, Intention to Repurchase키워드:
데이터홈쇼핑, 다크패턴, 개인정보수집, 프라이버시, 재구매 의향Ⅰ. 서 론
이커머스의 성장세에 비례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커머스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홈쇼핑도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항시 내재하고 있다. GS홈쇼핑이 ARS 설계 문제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지적받은 데 이어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SK스토아도 12만 5천여 건의 앱 부정 로그인 시도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된 바 있다[1],[2].
데이터홈쇼핑은 TV홈쇼핑과 달리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이용자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품 탐색과 구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용자 행태 정보들을 수집한다. 또한 데이터홈쇼핑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이커머스보다는 TV라는 매체적 속성으로 인해 상품 탐색과 구매 과정,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수집 정보도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AI 도입 등을 통해 개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홈쇼핑도 이용자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한편 홈쇼핑 주 이용자층은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가정주부로 최근 KB카드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주 이용자층이 60대 이상이고, 데이터홈쇼핑 주 이용자층은 40~50대로 나타났다[3],[4]. 전반적으로 홈쇼핑 이용자의 주 고객층 연령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홈쇼핑 주 이용자층은 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침해 우려 수준이 낮은 연령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정보 주체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 행사 및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에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의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홈쇼핑 주 이용자층의 특성상 이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크패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이용자들을 속여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기도 한다. 커머스 플랫폼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양면성도 가진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데이터 방송으로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공유의 문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이용자 인식 등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가 천착 되어 온 경향이 짙다. 이에 TV 매체를 통한 양방향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TV홈쇼핑과는 또 다른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인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현되고 있는 다크패턴의 유형들을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러한 경험이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재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한다. 기존에는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인식과 피해 경험이 서비스의 이용과 구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는 실증 연구들이 다수 축적돼왔다. 그러나 TV를 매개로 한 데이터홈쇼핑에 대한 연구는 TV홈쇼핑보다 관심을 덜 받아왔을 뿐 아니라 ‘TV’라는 속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상호작용성에 기반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방송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데이터홈쇼핑도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용자 개인의 인적정보에서부터 신용정보, 행태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데이터홈쇼핑 주 이용자층의 연령대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홈쇼핑의 프라이버시 이슈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데이터홈쇼핑의 이용, 즉 재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핌으로써 데이터홈쇼핑의 이용자 확대 전략과 개인정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홈쇼핑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홈쇼핑은 이커머스(E-commerce) 기술과 양방향 TV가 결합된 서비스로 디지털 셋톱박스를 통해 서비스된다. 티커머스(T-commerce)로도 불리는 데이터홈쇼핑은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의 합성어로 TV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TV홈쇼핑과 유사하다. 하지만 시청자가 리모콘이나 모바일 장치 등을 이용해 직접 상품정보를 선택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양방향 쇼핑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5].
데이터홈쇼핑은 2005년 TV홈쇼핑 계열사와 비홈쇼핑 계열사가 승인을 받았으나 디지털화가 미비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2년에 양방향 VOD서비스와 TV리모콘을 통한 상품주문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홈쇼핑 방송이 제공되기 시작했다[6],[7].
데이터홈쇼핑은 TV홈쇼핑과 달리 방송법상 법적 지위가 데이터 방송이다. 방송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데이터 방송이라 함은 데이터를 위주로 하며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적으로 데이터홈쇼핑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으로 전체화면 2분의 1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8]. 데이터홈쇼핑의 화면은 상품영상영역과 영상자막영역, 데이터자막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영상자막영역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데이터자막영역은 프로모션, 편성표, TV주문, VOD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TV홈쇼핑보다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이 많다[9]. 또한 데이터홈쇼핑은 시청자가 해당 채널에서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 제품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양방향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재생시간, 구매이력 등 개인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데이터방송의 개인화 서비스는 이용자 개인의 소비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제공 가능하다[10].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다[11],[12].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이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의 관행이나 원칙을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에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필수 제공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홈쇼핑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고지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TV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으며, 고지 내용도 상이하다.
데이터홈쇼핑은 TV를 통해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문 방법도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는 다르고 수집되는 행태 정보도 차이를 보인다.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주문방법은 TV 리모콘으로 주문하는 방법과 ARS 전화로 자동 주문하는 방법, 모바일로 주문하는 방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TV 리모콘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집정보 안내에 대한 고지와 동의 절차가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TV페이약관 및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한 전체 동의 및 가입 동의, 카드 정보 제공을 통한 가입 동의 등 동의 대상 및 방식이 사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홈쇼핑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보다 수집되는 개인정보나 이용, 고지 방식과 인식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관심이 적었던 측면이 있다. TV라는 매체적 속성이 가지는 제약으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동안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데이터홈쇼핑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원하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데이터홈쇼핑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는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보 과잉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여 다크패턴(또는 ‘눈속임 설계’)을 마케팅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다크패턴이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며 이탈을 막는 등의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다크패턴은 이용자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도 발견된다[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예약, SNS, 게임·콘텐츠 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 11가지를 유형화하였다[14].
가입-이용-탈퇴 단계별로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이 발견되는데, 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를 받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개인정보 공유와 같은 선택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한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동의’ 또는 ‘동의 간주’ 유형, 개인정보 공유 및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마치 개인정보 무단 활동에 동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설계, ‘가입’이나 ‘동의’와 같은 명시적 문구가 아니라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다음’ 등 불명확하거나 일회성 이용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유형 등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한편 데이터홈쇼핑은 TV 리모콘을 이용해 주문하는 경우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가 없는 대신 상품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동의와 카드 명의자 정보로 해당 쇼핑 가입 및 이용 동의 약관에 체크하는 화면 등이 등장한다. 배송 정보 등은 휴대폰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가 따른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의 절차에서부터 일반적인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과정과는 상이한 절차와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의 방식이 다크패턴의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미디어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상정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이 이용자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인지 수준을 점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들이 경험한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고찰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2-2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프라이버시 역설
데이터홈쇼핑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는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생성과 수집, 공유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의 편리성은 향상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조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정보 주체의 개입과 권리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의 확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도 증대되었다. 소극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함을 뜻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 변하였는데,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누구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타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상태로 개인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었다[15],[16]. 개인정보의 활용과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프라이버시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 인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가 인지하는 개인정보와 법적 정의상의 개인정보 간에도 괴리가 존재하고,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태도는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와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들에서 다뤘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다[17]-[20].
또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사실을 인지하는 이용자 중 확인하는 경우가 40.9%이며 이 중 반드시 확인하는 이용자가 3.7%,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59.1%에 이르렀다[21]. 2024년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다는 응답자는 37.2%로 소폭 감소했다.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처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성인의 경우 32.5%,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34.8%로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가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2].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장원창과 신일순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23].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도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이용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개인정보보호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침해 경험도 더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는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보호 행위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24].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 획득 수준과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수준도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5]. 이처럼 개인정보 처리 및 권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는 개인정보 보호 행위의 적극성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방증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정보 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정확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보면,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실제 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6].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로서의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에 대한 이용자 수요는 높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지 않아 이용자의 학습 노력이 병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보 주체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의 적극성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행동은 태도와 행위 간의 일치된 합리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행동도 공존하고 있음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태도와 행동 간의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는 주로 인식과 태도를 프라이버시 염려로 포섭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왔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의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미하고, 이를 수집, 통제, 인식 차원의 염려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1]. 이 중 인식은 기업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프라이버시 정책 투명성에 대한 염려는 인식 차원의 프라이버시 염려로 규정하였다[11].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근간이 되므로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나 인지 수준은 정보보호에 대한 인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인식 자체보다는 염려로 상징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들이 주류가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온라인 환경 내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합리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비직관적인 반대의 경향성도 발견되는데,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 현상으로 설명한다.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구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향성이 높지만, 반대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자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수 증명되었다. 후자와 같이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를 규명한 연구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비용을 따져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18],[20],[27]. 이처럼 프라이버시 우려와 이용자들의 행위간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기존에는 프라이버시 우려 또는 염려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 및 인식을 대변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아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통제와 관련한 정보 수집에 대한 인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데이터홈쇼핑 역시 데이터 기반의 커머스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연구 대상으로서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인지 수준, 즉 프라이버시 인지 수준이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정보처리자로서 데이터홈쇼핑 사업자가 기울여야 할 정보 제공의 투명성 제고 방식 및 정부 차원에서 이용자의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서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3 프라이버시 인식 및 피해 경험과 구매 행위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수집 정보에 대한 이용자 인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미미한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인식이 이용자의 거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인지와 확인 행위가 온라인 거래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지자와 확인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까지 하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23].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이용자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 침해 경험도 많은 이용자라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용자들이 온라인 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서비스 이용 충성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부합해야 하는 다섯 가지 공정 정보 관행 규칙 중 공지의 원칙을 준수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 프라이버시 신뢰에 영향을 주고, 신뢰는 태도적 충성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용행위를 대변하는 행동적 충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가 인지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행동적 충성도뿐 아니라 태도적 충성도에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네트워크 외부성이나 프라이버시 역설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29].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 조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므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명확하게 공시한 경우 해당 온라인 사업자에게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30].
한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터러시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 및 기기들로부터 추출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30]. 이에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능력과 프라이버시 염려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가 하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간 부적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후자의 경우 온라인 구매 행위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염려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31]-[33]. 그러나 TV홈쇼핑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낮을수록 TV홈쇼핑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프라이버시 염려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TV라는 매체 속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로 해석된다. 즉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능력이 다소 부족한 이용자들에게 TV홈쇼핑은 보다 용이한 커머스 플랫폼일 수 있고,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역량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나 인식을 프라이버시 염려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용자의 구매 행위나 서비스 이용행위를 살피는 연구가 많다.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용이나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 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이는 전자상거래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다[23]. 프라이버시 염려는 기업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명성은 구매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염려가 크게 되면 기업 명성에 해를 입히게 되고 결국 구매 경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34].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와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 우려와 실제 행위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우려가 클수록 온라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프라이버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 의향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공존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도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닌 프라이버시 염려나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경향이 두드러진데, 이 연구 결과들도 양면성을 지닌다.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지만, 프라이버시 염려가 서비스 이용 및 거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구매 의도와는 무관한 연구결과들도 발견된다[35]. 반대로 초창기의 연구들은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가 온라인 거래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36]. 이처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일치·불일치 여부를 다룬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이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되어 프라이버시 관련 행위의 복잡성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불일치 행위에 대해서는 이득과 혜택이 있다면 위험과 우려가 발생한다 해도 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를 설명하는 시도들은 프라이버시 계산이론 차원에서 해석하는 연구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프라이버시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는 현상을 두고 침해 경험 자체에 무감각해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37],[38].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보안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역시 일상화된다면 구매 경험에는 여러 연구들처럼 주 영향 요인이 아닐 수 있다. 데이터홈쇼핑은 데이터 기반 방송을 통해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TV리모콘을 통한 주문뿐 아니라 모바일과 연동한 구매도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홈쇼핑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소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제 방법의 안전성 인식, 결제서비스에 대한 신뢰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 품질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적은 있지만 프라이버시로 확장시킨 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또한 홈쇼핑의 성격상 남성 이용자보다는 여성 이용자의 이용률이 높으며 이용자층의 연령대도 다른 커머스 플랫폼보다는 높은 편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프라이버시 우려에 따른 보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3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줄이는 실질적인 실용성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인지 수준이 낮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인식과 피해 경험이 구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근거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경험이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의 차이를 비교한다. 나아가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지 수준,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의 차이가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프라이버시 인지 수준과 재구매 의향의 관계,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과 재구매 의향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지만, 태도와 행위간 관계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프라이버시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용자 특성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만의 프라이버시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타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프라이버시 인식 수준과 다크패턴 피해 경험을 비교하였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가 데이터홈쇼핑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 커머프 플랫폼에 대한 프라이버시 태도와 인식 수준을 비교해 비교우위에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였다.
- ⋅연구문제 1: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의 경험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는 데이터홈쇼핑과 타커머스 플랫폼 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및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의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만 19세 이상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데이터홈쇼핑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6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9.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3은 회귀분석, 연구문제 4는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데이터홈쇼핑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9명과 47명으로 각각 55.7%와 44.3%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만 60대 이상 응답자가 가장 많은 26명(24.5%)이며, 그 다음으로 만40~49세 응답자가 25명(23.6%), 만50세~59세 응답자는 22명(20.8%), 만30세~39세 응답자는 18명(17.0%)이며 만19세~29세 응답자는 14명(14.2%)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자가 74명(6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혼자가 27명(25.5%)이며 기타는 5명(4.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 주체인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항목, 개인정보 이용 현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였다.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유형 11개를 유목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1개 항목 중 데이터홈쇼핑을 통해 구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5개 피해 유형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5개 유형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만으로 가입 가능한 유형, 내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 불가능한 유형, 서비스 가입 후 추가 정보 요청 메시지 발신 유형, 회원탈퇴나 이용 해지 메뉴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유형으로 피해 경험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은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재구매 의사, 구매 권유, 재이용 빈도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 중 성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남성 이용자(평균=3.19)보다 여성 이용자의 인식 수준(평균=3.31)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남성 이용자보다 여성 이용자가 모두 높으며, 유일하게 개인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에서만 남성 이용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이 3.24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간 인식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개인정보 이용현황과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체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이용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데이터홈쇼핑의 주 이용자층인 50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평균=3.51)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가장 취약한 수준(평균=2.90)이고, 40대 이용자(평균=3.37)는 전체 평균(평균=3.22)보다는 높으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연령대로 볼 수 있다(F=3.209, p<.05).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체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용자가 가장 높은 인식 수준(평균=3.64)을 보여주며, 그 다음으로 20대(평균=3.40), 40대(평균=3.32) 순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상 이용자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대한 인식(평균=2.85)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F=3.529, p<.05).
개인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은 50대 이용자가 가장 높고(평균=3.50), 그 다음으로 40대(평균=3.44), 20대(평균=3.27) 순이며, 30대 이용자의 인식 수준(평균=2.8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F=2.955, p<.0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50대 이용자(평균=3.59)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대(평균=3.40)와 30대(평균=3.28) 순으로 집계되었다. 만 60세 이상 이용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인식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평균=2.81)을 기록하였다(F=2.638, p<.05).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항목들과는 대별되는데 유일하게 50대가 아닌 20대 이용자(평균=3.53)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50대(평균=3.50), 40대(평균=3.48) 순으로 조사되었다. 6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 인식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평균=2.77)을 보여준다(F=3.209, p<.01).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은 50대 이용자가 가장 높고(평균=3.50) 60대 이용자가 가장 낮은 수준(평균=3.00)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인식 수준은 20대가 가장 높고, 60대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식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용자로 각 항목들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0대 이용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지만, 세부 항목들 내에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용현황, 보유 및 이용기간이며, 특히 개인정보 관련 고객센터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기록하였다.
4-2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에 따른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수준이고,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 선택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추가 정보 요청 메시지, 정보제공 동의요청 지속 요구, 회원탈퇴 또는 이용해지 메뉴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일하게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정 불가한 피해 경험에서만 남성(평균 2.43)이 여성(평균 2.47)보다 더 많은 피해를 기록하였다.
연령에 따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가입 후 추가적인 정보 요청 메시지를 받는 사례 등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피해 경험이 발견되었다.
전체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은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중 4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평균=3.07) 반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가장 적은 수준(평균=2.40)으로 나타났다(F=2.674, p<.05).
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이 불가능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40대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평균=3.00), 그 다음으로 30대(평균=2.72), 20대(평균=2.60)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피해 경험이 가장 적고(평균=2.00), 그 다음은 50대 이용자(평균=2.23)로 조사되었다(F=3.209, p<.05).
서비스 가입 후 추가 정보 요청 메시지를 받는 등의 다크패턴 피해 경험 역시 40대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평균=3.12), 그 다음으로 30대(평균=2.78), 20대(평균=2.67) 이용자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이용자는 추가정보 요청 메시지와 같은 피해 경험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피해 경험을 기록하였고(평균=2.38), 그 다음으로 50대 이용자(평균=2.55)가 잇고 있다(F=2.760, p<.05).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가장 많은 40대 이용자는 다양한 다크패턴 피해경험 가운데 회원탈퇴 또는 이용해지 메뉴 없거나 찾기 어려웠던 피해경험이 가장 많으며, 내용을 보지 않고 동의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피해경험은 가장 적은 것(평균=2.96)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가장 적은 6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는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 및 수정이 불가능했던 경험이 가장 적고(평균=2.04), 회원 탈퇴 및 이용해지 메뉴 부재 또는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가장 많았던 것(평균=2.88)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 연령에 따른 피해 경험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항목 가운데 회원탈퇴 또는 이용해지 메뉴가 없거다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4-3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미치는 요인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특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요인이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7의 모형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66, F=3.616, p<.05). 즉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β=.240, p<.05). 반면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연령이나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재구매 의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데이터홈쇼핑 주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높고, 이들의 다크패턴 피해경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4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타플랫폼에 대한 프라이버시 인식과 피해경험 비교
앞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재구매 의향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이 주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타 플랫폼과 비교해 볼 때도 이러한 특성이 발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과 피해경험 수준을 플랫폼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Comparison of t-commerce users'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on other commerce platforms (Paired t-test)

Comparison of experiences of t-commerce users with other t-commerce platform privacy dark patterns (paired t-test)
먼저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평균=3.24)은 국내 오픈마켓(평균=3.25)보다는 낮고, 해외 오픈마켓(평균=2.5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 수준의 차이는 해외 오픈마켓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7.709, p<.001).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평균=2.68)은 국내 오픈마켓과는 동일한 수준(평균=2.68)이고, 해외 오픈마켓의 다크패턴 피해경험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평균=2.40), 후자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분석되었다(t=3.187, p<.001).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인식 수준은 해외 오픈 마켓에 대한 인식 수준보다 높고 피해경험 역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제품의 지속적인 재구매 의향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 성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보 인식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발생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특성과는 다른 차별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는 남성 이용자보다 여성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는 홈쇼핑 이용자의 주 고객층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4].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인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정보의 종류가 상이한 특성이 발견된다.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이용현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에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연령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50대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고르게 높은 인식을 보여주는 반면, 60대 이용자의 인식 수준은 거의 모든 정보에서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3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가장 낮고, 20대 이용자는 고객센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고객센터에 관한 정보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정보가 제공되기보다 고객센터를 직접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들기에 정보 검색에 능한 20대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홈쇼핑 주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이용자층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60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고객센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성별과 무관하고 연령에 따라 전체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 내가 제공하기로 동의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 불가능한 경험, 서비스 가입 후 추가정보 요청 메시지를 받은 경험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성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 이용자의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용자의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가장 많으며, 60대 이용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련 인지 수준이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다크패턴 피해경험 역시 낮은 인지 수준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다크패턴 피해에 해당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홈쇼핑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이며,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이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이 많지 않고, 주이용자층의 연령대가 높아 인지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TV 리모콘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 인터페이스의 제약으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처럼 다양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크다. 그러나 TV 리모콘을 통해 구매와 결제에 이르는데 인터페이스의 단순화로 발생하는 다크패턴 형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약관동의 과정에 포함된다거나 약관 등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동의가 가능하다던가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제에 이르거나 회원가입이 되는 등의 과정은 데이터홈쇼핑에서 발견되는 다크패턴이라 할 수 있다. 주이용자층의 연령대를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시킨 형태일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재구매 의향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은 타 커머스 플랫폼과 비교해 해외 오픈마켓보다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및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많고 국내 오픈마켓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이 해외 오픈마켓보다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많은 것은 이용빈도가 더 높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해외 오픈마켓보다는 우위 유지 전략을 취하고 네이버 쇼핑과 같은 국내 오픈마켓보다는 우위 확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데이터홈쇼핑 주이용자 층의 재구매 의향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층의 성별보다는 연령을 고려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과 전략 수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은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인식 제고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종합해 보면, 첫째,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개인정보 인식 수준과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을 진단함으로써 정보주체로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특성을 새롭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가장 미흡한 연령대는 50~60대로 알려졌지만, 데이터홈쇼핑의 주 이용자층인 5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60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가장 취약한데,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경험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반면 이들보다 통상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40대 이용자는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대 특성에 맞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데이터홈쇼핑을 통한 재구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인식이 높을수록 재구매 의사가 높지만,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기존 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함으로써 인식 수준이 높은 이용자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23]. 또한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경험이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 행동이 아닌 프라이버시 역설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들에게 프라이버시 인식 수준과 피해 경험 등을 고려한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신뢰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전략 도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데이터 방송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데이터홈쇼핑이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다뤄진 바 없어 데이터홈쇼핑도 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술한 학문적 또는 실무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중 데이터홈쇼핑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분석 대상 수가 적다는 제약이 있다. 데이터홈쇼핑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경우 성별 및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응답자들이 데이터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TV 리모콘을 이용해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과정에서 제공받는 정보 및 프라이버시 다크패턴 피해 경험 인지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역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적용해 이용자의 역설적 행위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역학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나오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홈쇼핑 이용자들의 재구매 의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회귀분석이 아닌 구조방정식 등을 통한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간 영향력을 살피기 위한 부분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오류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아, 데이터홈쇼핑 이용에는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의 영향력이 적을 가능성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피해 경험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세부적으로 유목화하거나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oan News. SK Store, Attempted Unauthorized Login via App... 125,000+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t Risk of Being Leaked [Internet]. Available: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4075, .
- NewsWorker. GS Home Shopping Raises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through ARS... Will It Be Investigat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nternet]. Available: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78, .
- The PR. KB Kookmin Card “How to ‘Purchase’? Shopping to See and Hear! [Internet]. Available: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25, .
- Y. Jung, Y. Kim, and Y. Oh, 2023 Korea Media Panel Surve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Jincheon, Policy Material 23-04-02, December 2023.
- Y. Kim, Y. Kim, H. Do, and N. Yoon, “The Purchase Decision Factors of Consumers Using T-commerce by Big Data Analysis,”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Vol. 24, No. 3, pp. 37-52, June 2021.
- J. Y. H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New T-Commerce Channels and Policy Measures for a Desirable Home Shopping Channel Ecosystem,” in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eminar, Seoul, May 2022.
-
S. C. Hong, “A Study of TV Homeshopping and Data Homeshopping Users’ Recognition of Real-Time Broadcasting, Subtitle Size, Immersion, and Purchase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4, No. 6, pp. 243-253, June 2024.
[https://doi.org/10.5392/JKCA.2024.24.06.243]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uidelines for Legal Application Standard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T-Commerce, Author, Gwacheon, September 2018.
-
S. R. Jeon, Y. S. Jang, and S. J. Choi,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Data Home Shopping and Traditional TV Home Shopping by Home Shopping Workers,”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 25, No. 2, pp. 218-232, March 2020.
[https://doi.org/10.5909/JBE.2020.25.2.218]

- ET News. Home Shopping with Data and Advanced Technology... Sales Are Also ‘Soaring’ [Internet]. Available: https://www.etnews.com/20201127000085, .
-
S. Kim and J. Kim, “Impact of Privacy Concern and Institutional Trust on Privacy Decision Making: A Comparison of e-Commerce and Location-Based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2, No. 1, pp. 69-87, February 2017.
[https://doi.org/10.9723/jksiis.2017.22.1.069]

-
D.-W. Heo and W.-J. Sung, “The Effect of Privacy Concerns on Using Mobile Payment Services: Moder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Consumer Innovativeness,” Informatization Policy, Vol. 28, No. 1, pp. 22-42, March 2021.
[https://doi.org/10.22693/NIAIP.2021.28.1.022]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uidelines to Create a Privacy Policy, Author, Seoul, 2024.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ment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of the Actual State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Three Major Vulnerable Areas of Mobile Apps, Author, Seoul, Press Release, January 2024.
- H. K. Oh and T. S. Kim, “A Study on User Perception of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Use and Privacy Invasion,” Review of Industry and Management, Vol. 30, No. 2, pp. 81-95, December 2017.
-
E. F. Stone, H. G. Gueutal, D. G. Gardner, and S. McClure, “A Field Experiment Comparing Information-Privacy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across Several Types of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8, No. 3, pp. 459-468, 1983.
[https://doi.org/10.1037//0021-9010.68.3.459]

-
T. R.Graeff and S. Harmo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Data: Consumers’ Awareness and Concern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Vol. 19, No. 4, pp. 302-318, 2002.
[https://doi.org/10.1108/07363760210433627]

-
H. J. Smith, T. Dinev, and H. Xu,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MIS Quarterly, Vol. 35, No. 4, pp. 989-1015, December 2011.
[https://doi.org/10.2307/41409970]

-
H. Lee, S. F. Wong, J. Oh, and Y. Chang,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ata from a Korean Media Panel Surve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36, No. 2, pp. 294-303, April 2019.
[https://doi.org/10.1016/j.giq.2019.01.002]

-
H. Han, M.-S. Lee, and H. Lee, “Is There a Privacy Paradox in the Online Purchasing Context?: The Study on the Effects of Privacy Concern and Online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 37, No. 5, pp. 1-13, October 2019.
[https://doi.org/10.36345/kacst.2019.37.5.001]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Author, Seoul, 11-1079930-000001-10, August 2012.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4 Annual Repor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uthor, Seoul, 11-1790365-000006-10, August 2024.
- W. Jang and I. Shin, “The Online Privacy Policy: Recognition, Confirmation and its Effects on Online Transac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2, No. 6, pp. 1419-1427, December 2012.
-
C. Park and S.-W. Lee, “A Study of the User Privacy Protection Behavior in Online Environment: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Vol. 15, No. 2, pp. 59-71, April 2014.
[https://doi.org/10.7472/jksii.2014.15.2.59]

-
J. Kim, An Analysis of the Consumer Privacy Protection Behavior in Online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February 2010.
[https://doi.org/10.23170/snu.000000033190.11032.0000513]

-
S. Y. Yoon and J. Yeo, “A Study on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9, No. 3, pp. 17-38, June 2018.
[https://doi.org/10.35736/JCS.29.3.2]

-
T. Dinev and P. Hart,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7, No. 1. pp. 61-80, March 2006.
[https://doi.org/10.1287/isre.1060.0080]

-
M. S. Kim, J. Kim, and S. Kim, “Impact of Mobile Messenger Privacy Policy on Loyalty of User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3, No. 7, pp. 1247-1256, July 2022.
[https://doi.org/10.9728/dcs.2022.23.7.1247]

-
J. Y. Tsai, S. Egelman, L. Cranor, and A. Acquisti, “The Effect of Online Privacy Information on Purchasing Behavior: An Experimental Stud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2, No. 2, pp. 254-268, June 2011.
[https://doi.org/10.1287/isre.1090.0260]

- P. Gilster, Digital Literacy, New York, NY: John Wiley, 1997.
- H. R. Choi and J. S. Shin, “Antecedents to Internet Privacy Concern and Their Effect on Perceived Trust for the Internet Transactio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16, No. 3, pp. 21-44, September 2007.
-
W.-S. Juang, C.-L. Lei, and H.-T. Liaw, “Privacy and Anonymity Protection with Blind Threshold Signa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Vol. 7, No. 2, pp. 143-157, 2002.
[https://doi.org/10.1080/10864415.2002.11044266]

-
J. Choi, C. Choi, S. Yang, and J. Kim, “Effects of Digital Literacy Capability and Privacy Concern on e-Commerce Usage Experience: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5, No. 6, pp. 1641-1654, June 2024.
[https://doi.org/10.9728/dcs.2024.25.6.1641]

- B.-K. Min and Y.-T. Kim,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rivacy Concern on the Online-Shopp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6, No. 11, pp. 25-37, November 2006.
-
D. J. Lee and M. S. Kim, “A Study on the e-Commerce Adopt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nd Response Behaviors,” The e-Business Studies, Vol. 12, No. 2, pp. 365-383, June 2011.
[https://doi.org/10.15719/geba.12.2.201106.365]

- I. Ryu, J. Shin, K. Lee, and H. Choi, “Antecedents to Internet Privacy Concerns and Their Effect on the Trust and the Online Transaction Intention of Internet User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 15, No. 4, pp. 37-59, December 2008.
- T. S. Jung and M.-S. Yim, “An Understan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Unconcern about Privacy Inform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6, pp. 49-59, July 2012.
-
C.-W. Park and J.-W. Kim, “An Empirical Research on Information Privacy Concern in the IoT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65-72, February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2.65]

- M. N. Lee and J. W. Shim, “The Moderating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nline Privacy and Use of Privacy Protection Strategy,” Media, Gender & Culture, Vol. 12, pp. 165-190, October 2009.
저자소개

2004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석사)
2014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박사)
1999년~2001년: KBS부산방송총국 구성작가
2006년~2009년: MBC
2015년~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현 재: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미디어 정책,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호보, 이용자 보호 정책 등